[논평] 부산대학교 미술관 벽돌 추락사고,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조치를 통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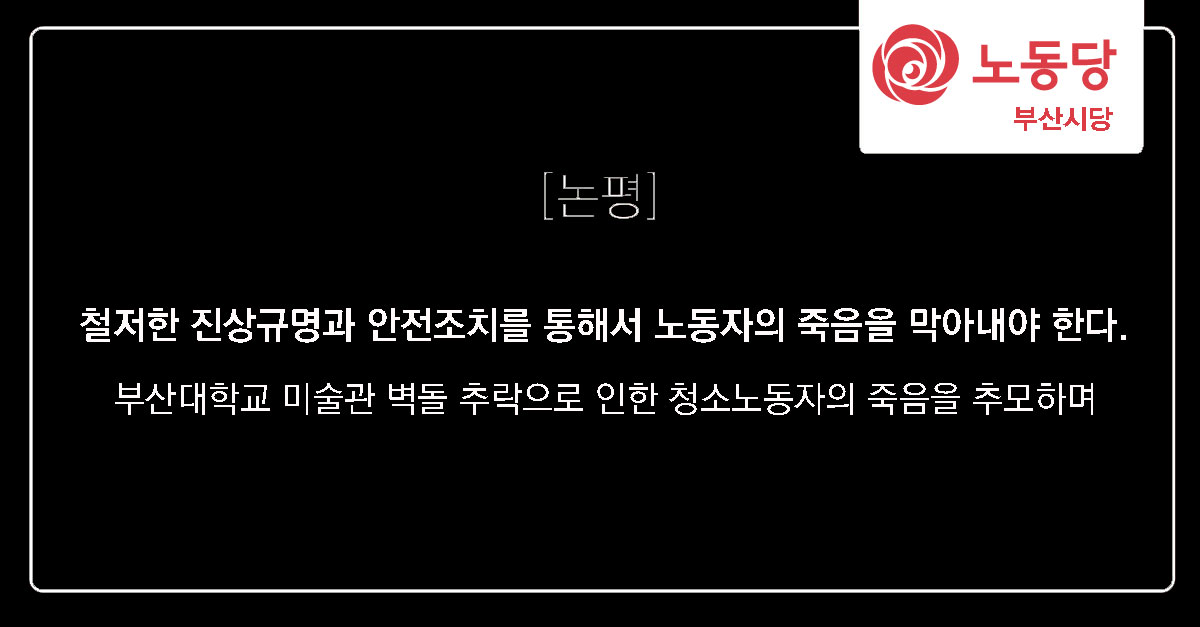
부산대학교 미술관 벽돌 추락사고,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조치를 통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.
어제, 5월 21일 부산대학교 미술관 외벽에 부착된 벽돌 수백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었던 60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. 미술관 건물은 1993년 9월에 준공 된지 26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. 지난해 6월~12월까지 진행된 정밀 점검에서는 B등급을 받은 건물이었다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B등급은 ‘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,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’로 규정하고 있다. 쉽게 말해 큰 문제없는 안전한 건물이었다는 말이다. 그렇다면 안전한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서 왜 노동자가 죽은 것일까.
그 단서는 ‘정밀 점검’이라는 말 속에 있다. 현행법상 안전점검은 크게 ‘안전점검’과 ‘정밀안전진단’으로 나뉜다. 안전점검은 미술관 건물이 받았던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총 3가지로 나뉘어져있다.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긴급안전점검을 제외하고는 ‘외관조사’를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다. 정밀안전진단은 외관조사를 넘어서 ‘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’등을 조사하여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‘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.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도 외관조사, 즉 육안으로 검사를 했다. 그 결과 B등급이 나왔다. 하지만 정작 건물의 외벽이 무너졌고 노동자가 죽었다.
현행법에 따르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 시설은 지난해 1월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건립 15년 이상, 연면적 1천㎡이상 학교시설은 ‘안전점검’ 의무대상이 되었다. 하지만 가장 세밀하게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은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. 부산대는 이보다 기준을 강화해 30년이 넘은 건물 중 정밀 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건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했다.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은 26년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
결국 현행법의 틈새에서 죽음이 일어났다. 경찰과 학내외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조사결과로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밝혀내고 더 강화된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.
이 사건에 관해서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. 바로 언론에서 이 사고를 다루는 방식이다.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언론은 일제히 ‘학생들까지 위협에 처할 수 있었다.’ ‘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.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.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표시나 그의 그림자조차 언론의 보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. 학생들은 위험에 처해선 안 되고 청소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것인가?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작은 사고이고 학생들이 다친 사고는 더 큰 사고인가? 어떤 근거로 죽음과 사고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고 크고 작음을 논하는지 알 수 없다.
이번 사고는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크고 중한 사고이다.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하는 것이다. 청소노동자가 죽은 것은 큰 일이 아니지만 학생들까지도 다칠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니다. 죽음에서 조차 평등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.
노동당 부산시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청소노동자의 명복을 빈다.
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강화되어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.
2019년 5월 22일
노동당 부산시당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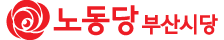
 [논평] 파업은 재난이 아니다 /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을 지...
[논평] 파업은 재난이 아니다 /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을 지...